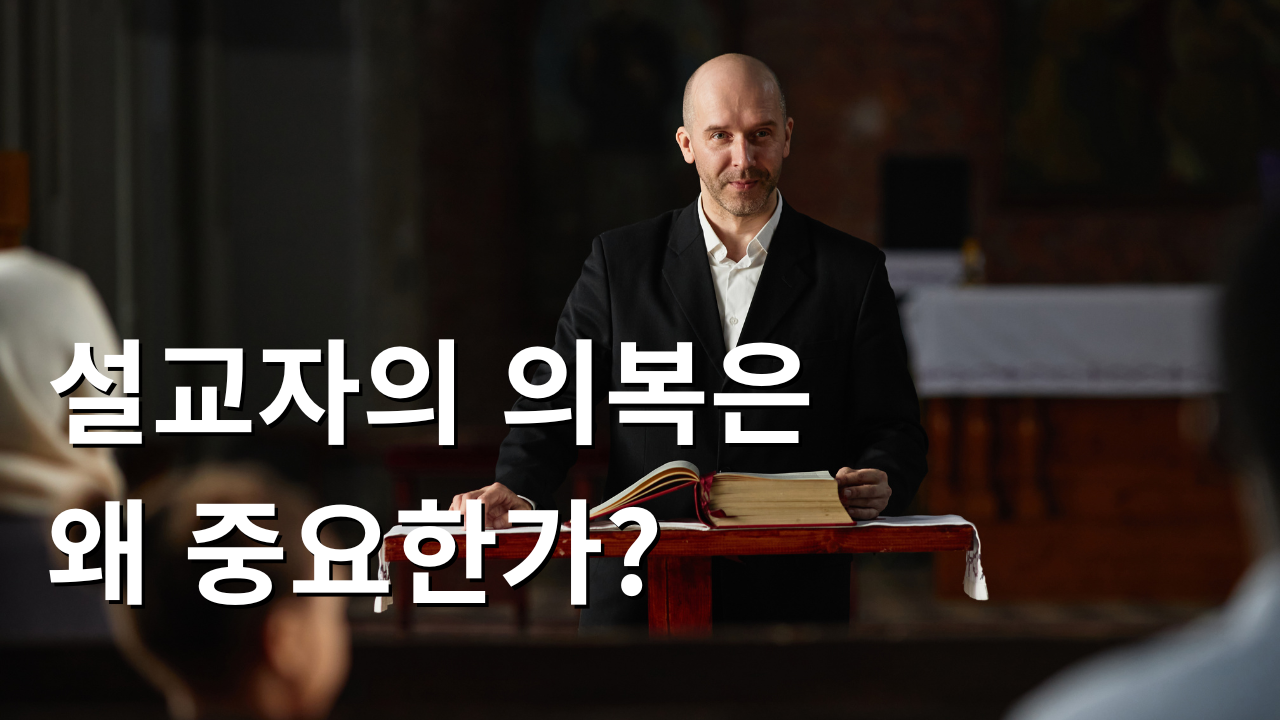
주일 아침, 목회자의 복장은 단순한 스타일 그 이상일 수 있다.
예복을 입는 전통교회와 달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복장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입는가’는 언제나 메시지를 전한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기독교 초창기 성직자들은 자신들을 양떼와 구분짓는 특별한 복장을 채택했다. 당시 로마와 그리스 제국에서 흔히 입던 긴 로브는 점차 일상복에서 사라졌지만, 교회는 그 복식을 성직자의 옷으로 유지했고, 결국 오늘날의 예복(vestments)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재도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동방정교회 등 여러 교단에서는 명확한 복장 규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 특히 ‘로우 처치’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복장의 의미와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설교자는 반드시 차려입어야 할까? 아니면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섞여야 할까? <처치앤서스> 샘 레이너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복장은 메시지를 담는다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은 절제와 준비, 존중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반면 성도들과 비슷하게 입는 것은 친근함과 접근성을 전달한다. 문제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의도하든 ‘복장은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복장을 전략적으로 고르기보다는 습관이나 직관에 따라 결정한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 성향, 심지어 취미까지 복장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는 시계나 드레스 슈즈에 관심이 많아 그에 따라 옷을 갖춘다. 또 어떤 이는 활동성과 편안함을 중시해 후디와 스니커즈를 선택한다.
하지만 시대와 나이도 무시할 수 없다.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한 스타일링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연륜과 체형의 변화에 따라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진화해야 한다는 조언은 설득력 있다.
캐주얼도 하나의 ‘상징’이 된다
복장이 꼭 ‘격식’이 아니더라도 ‘의미’는 존재한다. 스니커즈, 후디, 청바지 같은 캐주얼 아이템도 브랜드와 희소성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만년필, 성경의 특정 판본, 서류가방까지도 마찬가지다.
목회자 역시 소비자이며, 각자의 선택은 개인의 성향과 철학,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 어떤 이는 차량 비용을 줄이고 구두나 필기구에 투자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입는가’에 대한 자각이다.
결론: 복장보다 중요한 것, 그러나 복장도 말한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그림 앞에서 복장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복장에 대해 성도들이 꽤 많은 피드백을 주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니 패션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고 자각 있게 선택할 필요는 있다. 어떤 이는 성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연스러운 복장을 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단정함과 절제를 보여주기 위해 격식을 갖출 수 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후디를 입고 설교하는 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누군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복장보다 더 깊은 마음이죠.”
결국 복장은, 그 사람의 내면과 철학을 조용히 반영하는 ‘또 다른 설교’일지도 모른다.
